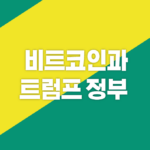‘7광구’는 어디인가? 왜 지금 다시 회자되는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7광구, 제주 남쪽 동중국해 대륙붕에 위치한 이 해역은 1970년대부터 우리 정부가 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구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변과 더불어, 이 오랜 침묵의 해역이 다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7광구는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의 정지 버튼: 한일 협정의 탄생
7광구 개발이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978년에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협정입니다. 당시 동중국해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양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은 1979년부터 효력을 발휘했고, 총 7개 구역 중 일부가 바로 지금의 7광구에 해당합니다.
이 협정은 50년 기한이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단독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은 일본이 주도했고, 1990년대 이후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던 7광구, 다른 나라들은 움직였다
그 사이, 일본은 7광구와 맞닿은 인근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중국 또한 동중국해에 걸쳐 있는 자국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만 유독 협정의 틀 안에 갇혀, 독자적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때 공동개발은 외교적 타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원 확보에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에너지 수급 불안과 자원 무기화 흐름이 확산되면서, 이런 정체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8년, 협정 만료가 가져올 변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후,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에 종료됩니다. 2028년 이후, 한국은 단독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이 협정 만료 후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해역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지대이기도 해서, 해양경계 협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기술력,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거에는 기술 부족이 7광구 개발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동해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해양 시추 및 지질 탐사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7광구 재개발을 위한 핵심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7광구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체적으로 탐사 타당성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남은 건 정부의 의지와 외교적 결단입니다.
7광구 개발이 가져올 파급 효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 및 가스의 일부를 자국 해역에서 충당할 수 있다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과 탐사 장비, 해양법률 전문가 등의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한일관계, 동중국해 질서, 해양 경계 협상 등 외교적 지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입니다.
제7광구 관련 주요 연표
| 년도 | 내용 |
|---|---|
| 1978 | 한일 공동개발협정 체결 |
| 1980~1990 | 일본 중심의 탐사 진행 후 중단 |
| 2000~2010 | 사실상 탐사 및 개발 정지 상태 |
| 2022~ | 에너지 위기와 함께 재개발 논의 확대 |
| 2028 | 공동개발협정 만료 예정 |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제7광구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해양 자원을 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국제 해양질서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동개발’이라는 말로 묶여 있기보다는, 주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